 |
| /그래픽=윤선정 디자인기자 |
지난달 17일 대전에 위치한 씨이텍에서 직접 확인한 탄소포집 설비의 모습이었다. 씨이텍은 탄소포집 흡수제 등의 특허를 다수 보유한 업체로, SK E&S의 협력사다. 씨이텍이 공개한 것은 국내 및 미국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실증시설을 축소한 모델이었다.
일반적으로 탄소포집 설비는 흡수탑과 재생탑 두 개로 구성한다. 처음 흡수탑으로 각종 가스가 들어오고, 재생탑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흡수탑에는 흡수제가 있어서, 탄소포집이 일어난다. 흡수제는 '습식(액체)'으로 만드는 게 스탠다드가 돼 가고 있다. 재생탑에서는 스팀 과정을 통해 탄소를 흡수제에서 분리할 수 있다. 포집을 완료한 탄소는 재자원화하거나, 지하 깊은 곳에 저장하면 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탄소포집 프로세스를 두고 "수십 년 전부터 활용해오던 방식"이라고 한다. 각종 가스에서 탄소를 포집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검증이 끝난 방식이란 의미다. 실제 탄소포집은 20세기 초부터 천연가스를 지하에서 채굴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불순물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로 활용해왔다.
 |
| 씨이텍의 탄소포집 설비 축소 모델 /사진=최경민 기자 |
흡수제와 탄소를 분리하는 스팀 과정이 있고, 여기에 '연료'를 써야하기 때문에 탄소도 일정수준 배출한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 포집량이 배출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라며 "연료 효율성을 높여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것도 숙제"라고 설명했다.
열쇠를 쥔 건 흡수제라는 평가다. 흡수제가 얼마나 잘 탄소를 포집하느냐에 따라 효율성과 경제성이 결정나기 때문이다. 미국의 플라워와 아이온, 네덜란드의 쉘, 독일의 린데와 바스프, 일본의 히타치 등이 기술 개발에 나선 이유다. 씨이텍은 최근 탄소포집 과정에서 필요한 열 에너지를 기존 대비 60% 수준으로 낮춘 흡수제 'CT-1'의 실증에 성공하며 업계의 눈길을 끌었다.
이광순 씨이텍 대표는 "탄소포집을 안 할 수가 없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기업들도 활발하게 사업들을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점점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든지 비용을 줄이는 기술을 만드는 것, 거기에 포커싱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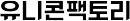















![4년전 아빠가 준 8천만원 신고했는데...엄마가 또 5천만원 준다면?[TheTax]](https://thumb.mt.co.kr/11/2025/05/2025051706552359990_1.jpg/dims/resize/100x/optimize/)
![[속보]이재명 "이명박 4대강 40조는 되고, 지역화폐는 안 되나"](https://thumb.mt.co.kr/11/2025/05/2025051613553456150_1.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사망자에 "이달 보험료 내라"…1일에 숨져도 건보료 걷었다](https://thumb.mt.co.kr/11/2025/05/2025051210342685361_4.jpg/dims/resize/100x/optimize/)



















![[단독]김수현과 3년여 만난 '아이돌' 여배우…어긋난 김새론 6년 열애설](https://thumb.mt.co.kr/10/2025/04/2025042512471784918_1.jpg/dims/resize/100x/optimize)
![[속보] 김동연, 호남 경선 2위 결과에 "겸허히 수용…수도권 경선도 최선"](https://thumb.mt.co.kr/10/2025/04/2025042617303634064_1.jpg/dims/resize/100x/optimize)

!["코 막혀" 병원 갔는데 '종양'이…"HPV와 관련" 뭐길래 [한 장으로 보는 건강]](https://thumb.mt.co.kr/10/2024/12/2024120617204571583_1.jpg/dims/resize/100x/optimize)











![차은우♥고윤정·변우석♥채수빈, 절대 못 잃어..레전드 '얼굴 합'으로 일냈다 [★FOCUS]](https://thumb.mtstarnews.com/05/2025/05/2025051617280213231_1.jpg)













!['유퀴즈 그 사람' 김한규 "홍준표·한동훈, 한덕수와 단일화 안할 것"[터치다운the300]](https://i3.ytimg.com/vi/R61uXO9_sJQ/hqdefault.jpg)
![홍준표 "단일화? 의미 있는 무소속 후보 없을 것...이재명 상대 판 뒤집을 수 있다"[터치다운the300]](https://i2.ytimg.com/vi/IXikldiFmok/hqdefault.jpg)
!["중국 편에 서면 나라를 잃고, 미국 편에 서면 공산당을 잃는다"베트남 '대나무 외교' 꺾일까 [DonQ 편집장의 미국 대 중국]](https://i1.ytimg.com/vi/0u9dFkcQaF4/hqdefault.jpg)
![김문수 "난폭한 이재명 이길 사람...제가 약해보여요? 턱걸이 하러 갈까요?" [터치다운the300]](https://i3.ytimg.com/vi/6sQHLYq8PXU/hqdefault.jpg)




![[채승병 박사]"실전 경험 너무나 위협적", 북한 기습 가능할 정도로 재래식 격차 줄었다](https://i3.ytimg.com/vi/FDXADte_650/hqdefault.jpg)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많이 고민하고 있다"[터치다운the300]](https://i1.ytimg.com/vi/lnTGywXtwkM/hqdefault.jpg)
![[채승병 박사]저가형 드론 백만대로 최전선 버틴 우크라이나.. 로우테크 물량전 시대 열렸다](https://i2.ytimg.com/vi/5M0BAUDvdpU/hqdefault.jpg)
!["이러다 단일화 무산된다"...‘김문수vs한덕수’ 갈등에 국민의힘 비상[터치다운the300]](https://i2.ytimg.com/vi/yVLeHaT-H4Q/hqdefault.jpg)




![엄경영 "한동훈, 김문수 역전할 가능성은 OO%...한동훈 후보 되면 단일화 난항" [터치다운the300]](https://i4.ytimg.com/vi/3CUwTzWmYTw/hqdefault.jpg)
![한국은 중요한 중심축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와 빠르고 긴밀히 협력해야" [2025 키플랫폼]](https://i4.ytimg.com/vi/WlrIShFeNFg/hqdefault.jpg)

![이재명 역전 노리는 김동연 "감세하며 돈풀기? 표퓰리즘"[터치다운the300]](https://i2.ytimg.com/vi/u9vqSmiZ0Vw/hqdefault.jpg)
